
현대경제신문 홍미경 기자 |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결과 K팝의 인기는 그 어느때보다 뜨겁지만, 음반과 수출 지표만 놓고 보면 성장세는 이미 3년째 둔화·역성 구간에 들어섰다. 2022년 팬데믹 특수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조정, 2024~2025년 완만한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2022년 K팝 피지컬 음반 판매량은 팬데믹 시기 ‘다중 버전·팬 사인회용 앨범’ 수요까지 겹치며 1억 장 안팎으로 급증, 글로벌 붐과 함께 사실상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평가다. 2023년 국내에서 집계된 음반 판매량은 약 1억1570만 장으로, 사상 처음 ‘1억 장 시대’를 연 해였다. 다만 이때가 정점이었고, 이후 증가 속도가 꺾였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2024년 써클차트 연말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음반 판매량은 약 9330만 장으로 1년 새 19.5% 감소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뚜렷한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2025년)도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8000만 장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연간 기준으로는 2024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소폭 줄어드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공통된 전망이다. 팬데믹 국면에서의 과열된 수요가 빠지고,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 재조정되고 있다는 의미다.
수출 역시 3개년 흐름이 비슷하다. 관세청 통계와 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2022년 K팝 음반 수출액은 약 2억3140만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며, 2019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됐다. 2023년 전체 K팝 해외 매출이 1조원을 돌파하는 가운데, 음반 수출액도 3억달러대(원화 기준 3천억원 이상)로 사상 최대 구간을 형성했다.
2024년부터 2025년 올해 10월까지 누적 음반 수출액은 2억438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일본이 –10.8%, 미국 –5.1%로 역성장하면서, 전체 성장세를 끌어내렸다.
즉, 글로벌 인지도와 공연 매출은 계속 커지는데, 정작 ‘피지컬 앨범’이라는 전통적 수출 축은 팬데믹 특수 이후 고점 대비 미세한 하락과 정체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내 디지털 차트에서도 K팝의 위상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최근 써클 디지털 차트 주간 톱10(9~15일 기준)에서 국내 아이돌 그룹 곡은 엔믹스·르세라핌·화사·블랙핑크 4곡에 그쳤다. 한때 뉴진스, 에스파, 아이브 등이 톱10 대부분을 장악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K팝 점유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셈이다.
또한 신곡 소비 비중이 줄고, 장기 스테디셀러와 비(非)아이돌 곡 비중이 늘면서 음원 시장은 ‘롱런 곡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신곡 이용량 데이터를 보면 단기 흥행이 둔화하고, 최신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조금씩 빠지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해외 공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이브는 2024년 3분기 공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뛰었지만, 같은 분기 전체로는 422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신인 그룹 론칭 비용, 마케팅·콘텐츠 제작비가 크게 늘면서 대형사조차 ‘매출은 늘고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에 부딪힌 것이다.
중소기획사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앨범·음원 매출 둔화와 콘서트 시장의 상위사 쏠림 속에서, 이른바 ‘중소돌의 기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실제로 걸그룹 퍼플키스, 위클리, 에버글로우 등이 해체 또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히트곡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로 주목받은 하이키는 소속사를 옮기며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평론가들은 K팝 산업이 ‘성장 피로’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3개년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건, K팝이 더 이상 ‘무조건 성장’ 국면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2년 팬데믹 특수와 글로벌 팬덤 확장으로 음반·수출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면 2023년애는 고점 유지 속 증가세가 둔화됐다. 2024부터 2025년 내수 기준 음반 판매 1억 장 아래로 내려앉으며 하향 안정화 된 상황이다.
이에 한 음반 관계자는 "공연·IP·콜라보 프로젝트 등 새로운 수익 축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앨범·음원이라는 핵심 지표는 ‘양적 성장의 끝’을 알리고 있다"라며 "산업 트렌드 리포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피지컬 중심 모델에서 팬덤 플랫폼·IP 비즈니스로의 전환, 대형사 중심 구조 속 중소사·신인의 생태계 복원, 내수 팬덤과 해외 팬덤의 균형 재설계 과정이라고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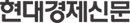 홍미경 기자
홍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