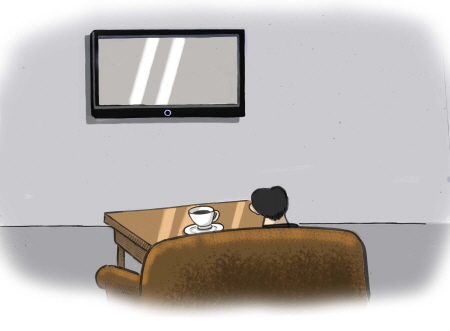
2015년 7월 어느 날 저녁. 무척이나 후텁지근한 날이었다.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온 나는 혼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리모컨을 찾아 텔레비전부터 켰다. 텔레비전에서는 7시 뉴스가 끝나가고 있었다. 도심의 공원 분수에서 무더위를 식히는 사람들 모습이 화면에 비치고 ‘살인적인 더위’니 ‘가마솥 더위’니 하며 호들갑을 떠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텔레비전 혼자 떠들게 내버려두고, 나는 새 내의들을 꺼내 욕실 앞에 내려놓고 옷을 모두 벗었다. 욕실로 들어가 약간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양치질을 했다. 온몸을 감싸고 있던 끈적끈적한 땀이 말끔히 닦여지자 날아갈 듯 개운했다. 나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욕실을 나와 새 내의로 갈아입었다. 샤워를 하는 동안 텔레비전에서는 스포츠 뉴스마저 끝나고 있었다.
적당히 평화롭고 쓸쓸한 저녁시간이었다. 나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파워버튼을 눌렀다. 인터넷 포털에 접속하자 새 편지가 한 통 와 있다는 메시지가 보였다. 편지읽기로 들어가 보니 아이디 evergreen80이 보낸 <저예요>라는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순간 눈이 의심스러웠다.
나에게 다짜고짜 ‘저예요’라는 제목의 메일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스펨메일을 제외하고는 evergreen80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 단 한사람뿐이었다. evergreen80…… 황은영…… 내 가슴을 떨리게 한 최초의 여자. 그러나 나에게 아무 이유도 밝히지 않고 증발해버린 수수께끼 같은 여자……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눈을 감았다 뜨고 다시 보았지만 그녀가 보낸 메일이 확실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지를 클릭했다.
2015년 7월 13일 오후 1시 안동역
긴 사연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내용이라곤 오직 그것뿐이었다.
스크롤 바를 내려보니 JPG파일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생머리를 뒤로 묶고, 물방울무늬가 들어간 살구빛 티셔츠에 파스텔 톤의 체크무늬 플레어 치마를 입고 있었다. 어떤 건물인지 알 수 없지만 돌계단에 앉아 희미하게 미소짓고 있었는데, 치마 아래로 가지런히 모인 정강이가 보였다. 집 가까운 곳에서 찍은 사진인 듯어쩌면 집인지도 모르겠다맨발에 슬리퍼를 꿰어 신은 모습이었다. 사진 오른쪽 하단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2014년 09월 04일. 일 년 전 사진이었다. 내가 모르는 시간 속의 그녀.
‘2015년 7월 13일 오후 1시 안동역’은 그곳에서 만나자는 뜻 같았다.
나는 약간 어처구니가 없었다. 왜 이런 식으로 연락을 보내온 것일까. 쑥스러워서?
하긴…… 나는 한숨을 내쉬며 빙긋 웃었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은 지 오 년만에 보내온 이메일이었다. 나는 이메일 내용에 충분히 만족했다.
그런데 7월 13일이면 바로 내일이었다. 내일 오후 한 시, 안동역. 그런데 그녀가 메일을 보낸 시각은 오늘 오후 세 시였다. 너무 급하게 잡은 약속이었다. 그녀가 날짜를 잘못 적은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커피잔을 꺼내 커피와 프림, 설탕을 알맞게 탔다.
금세 물이 끓기 시작했다.
나는 끓는 물을 커피잔에 따르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때까지 켜져 있던 텔레비전을 끄자 뒷집에서 서툴게 오카리나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부는 소리. 그 애는 저녁시간마다 그렇게 악기를 불어댔다.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에는 클라리넷을 불었었다. 그리고 피콜로, 단소, 플루트를 거쳐 이번에는 오카리나를 불어대는 것이다. 작은 악기들은 한번쯤 다 섭렵해볼 작정인 듯했다. 지겨울 때도 있지만 인사성이 밝은 아이라 나는 즐겁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혹시 아는가. 누군가가 그 애를 남몰래 흠모하고 있을지도. 그 남학생에게 그 애의 오카리나 소리는 천상의 음악으로 들릴 것이다.
나는 자판을 두드렸다.
갑작스런 메일 반가웠어.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 사는지, 잘 지내고 있는 건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약속날짜가 7월 13일, 정말 맞아? 혹시 전화해줄 수 있어?
메일을 전송하고 나는 가방에서 인터뷰 약속이 되어 있는, 두 번이나 이혼한 여류 소설가의 저서들을 꺼냈다.
나는 중요한 구절에 밑줄을 쳐가면서, 질문할 내용을 메모해가면서, 빠른 속도로 여류 작가의 소설집 한 권을 읽어나갔다. 전생에 원수였다가 다시 만난 사이처럼 사사건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충돌하는 부부들의 이야기였다. 어느 가정은 이혼을 하고, 어느 가정은 아내가 가출을 하고, 어느 가정은 부부가 서로 맞바람을 피웠다. 특별히 재미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재미없지도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은영에게서 오 년만에 연락을 받은 날 읽고 싶은 책은 아니었다.
나는 중간쯤 읽다가 건너뛰어 책 뒷부분에 있는 <거래로서의 사랑, 붕괴되는 가정, 여성의 자아 찾기>라는 제목의 비평을 읽고 책을 덮었다.
그럭저럭 세 시간이 흘러갔다. 오카리나 소리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그녀는 아직 메일을 읽지 않았고, 당연히 답장은 없었다. 그녀가 내 전화번호를 잊어먹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적어 다시 메일을 보냈다.
그런 다음 재떨이를 비우고, 빈 커피잔을 치우고, 텔레비전을 켰다. 마감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하나 꺼내 한 모금 한 모금 홀짝거리면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았다.
뉴스가 끝났을 때는 캔도 비워져 있었다. 다시 메일을 확인해보았다. 두 통의 메일 모두 아직 읽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었다. 이미 자정이 지난 시각, 이젠 어쩔 수 없었다. 안동역으로 찾아는 수밖에.
나는 그녀의 사진을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고 컴퓨터를 껐다.
실내등을 끄고 침대에 눕자 어둠 속에 그녀의 모습이 커다랗게 떠올랐다.
163센티미터의 키에 45킬로그램에서 48킬로그램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몸무게…….
나는 그녀가 정장 차림에 구두 신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녀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치마보다는 바지를 즐겨 입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저절로 빛났다. 늘 입술이 촉촉했고, 뺨에서는 윤기가 났다. 1980년 봄,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고등학교 영어교사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일남 이녀의 둘째딸로 태어난 여자. 그녀는 검소하고 사치를 몰랐다. 기분 좋을 때는 제 흥에 겨워 계속 노래를 불러대던 조금은 푼수 같은 여자. 몸도 마음도 건강했지만 불규칙한 식사 때문인지 아니면 예민한 성격 때문인지 항상 소화제와 위장 제산제를 소지하고 다녔다. 미수가루는 먹기만 하면 토하고, 흰 우유는 마시기만 하면 설사를 했다.
그녀와 나는 일 년 동안 이 집에서 함께 살았다.
이 집에는 그녀의 겨울 반코트와 스웨터, 청바지 몇 벌, 그녀가 신던 슬리퍼, 베개, 수저, 그녀가 입술을 대고 마시던 찻잔, 여고 시절의 그녀 사진이 들어 있는 액자 등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다. 머리카락도 몇 가닥쯤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 우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부부처럼 함께 밥을 해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잔 사이였다.
그리고…… 이제 열세 시간만 지나면 그녀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날 것이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