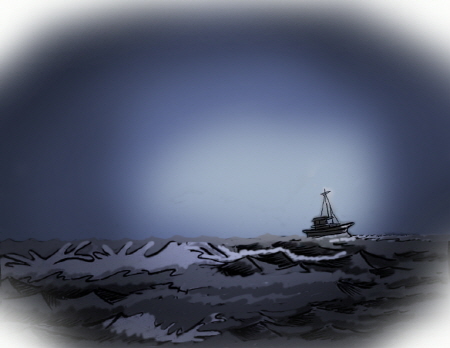
4장
배제고보 시절과 도일
2
배제고보 교정의 전나무 숲을 거닐던 정식이 앞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배찬경이 누구와 함께 오는 중이었다. 굵은 검은 테 안경을 썼는데, 어서 본 듯한 사람이었다.
“어이, 정식 군, 찬경 군을 만나니 자네가 여기 있을 거라고 하더군.”
배찬경을 따라오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건넸다. 다가온 얼굴을 보니 나빈(稻香 羅彬)이었다. 경성에 올라온 직후 김억의 소개로 만난 적이 있었다. 나빈은 정식과 동갑내기였지만, 이미 3년 전(1919년)에 배제고보를 졸업했다. 요즘에는 현진건(玄鎭健), 홍사용(洪思容), 이상화(李相和), 박종화(朴鍾和), 박영희(朴英熙) 등과 함께 《백조(白潮)》 동인으로 활동하는 중이었다. 《백조》 창간호에 단편소설 ‘젊은이의 시절’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얼굴을 내밀었다.
둘은 악수를 나누었다.
“자네가 우리 조선문단의 샛별로 떠올랐더군. 축하해 주려고 일부러 찾아왔네.”
나빈이 손에 든 《개벽》 잡지를 들어 보였다.
“자네 시가 무려 40편이나 실렸어. 우리 학교 편입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더니만, 시까지 그리 잘 쓸 줄은 몰랐네. 김억 선생님 말씀이 맞았네. 수재가 나타났어, 수재! 정말 우리 조선문단이 자네 때문에 개벽을 하겠어.”
나빈은 정식을 가까운 벤치로 이끌었다. 배제고보 출신이라서 지금도 학교에 다니는 사람처럼 스스럼이 없었다. 정식과 배찬경이 앉고, 나빈은 앞에 섰다.
“빈 말 하지 말게.”
정식이 계면쩍게 대꾸했다.
“월탄(月灘 朴鍾和)이 시평에서 뭐라 한 줄 아나?”
나빈이 《개벽》지의 한 부분을 펼쳤다.
“‘무색한 우리 시단에 소월의 시가 있다. 소월은 우리 민족의 혈관 속에 흐르는 조용한 인정과 꿈과 눈물과 순정을 남김없이 가지고 있는 시인이다.’ ‘소월의 시도 대개가 애절과 무상을 감춘 함축 있는 민족시라 하겠다. 그러므로 소월 시의 정조(情調)는 바로 우리 민족의 감정이며 우리 민족의 낭만인 것이다.’ 신인을 이렇게 극찬하는 경우를 보았는가.”
나빈이 《개벽》지를 정식에게 건네려 하자 배찬경이 냉큼 가로챘다.
“자네 이름이 이젠 소월이 되었군. 소월, 흰 달, 소박한 달, 겸손한 이름이어서 좋군.”
배찬경도 《개벽》지의 접힌 부분을 펼쳤다.
“내가 한 편 읊어 보겠네.”
배찬경이 눈으로 시를 골랐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히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진달래꽃’ 전문
“아직도 잊지 못하는 오순, 그 오순을 잊으려는 애절한 몸부림이 담았군. 근데, 자네가 오순을 배반했지 오순이 자네를 배반했나?”
배찬경이 빈정거렸다.
“무슨 소린가?”
나빈이 눈동자를 번쩍 키웠다.
“자네가 오순 양을 그토록 사랑했단 말인가? 종로 기생 오순 양을?”
나빈이 의문을 가득 담은 눈으로 덧붙였다.
“말조심하시오. 나빈 선배! 오순 양은 김정식, 아니 소월 군의 옛 애인인데다 요조숙녀요. 이미 훼에엥 딴 인간 품으로 날아갔지만.”
배찬경이 나빈을 향했던 눈길을 정식에게 옮겼다.
“그런데 자넨 시인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독립운동의 가시밭길을 더 흠모하는 듯하더니만, 결심을 바꾸었나? 잘했네, 잘했어. 실바람에도 건들거리는 갈대 같은 시인에게는 운동가의 가시 면류관보다는 어여쁜 여자들이 애용하는 화관(花冠)이 어울리네.”
배찬경이 빈정거리는 말투를 바꾸지 않았다.
“자네처럼 대놓고 하는 독립운동만 독립운동이 아니라네.”
정식이 혼잣말을 하듯 변명했다. 시인으로서 속에 품은 뜻을 자세히 밝히고 싶었지만, 말을 앞세우기 싫어 꾹 눌렀다.
“근데 말이야. 오순의 남편이 주정꾼이라는군. 걸핏하면 오순에게 뭇매를 놓는다네. 매에 골병이 든 몸으로 주정꾼 남편 뒤치다꺼리하랴 농삿일하랴 힘겹게 산다네.”
정식이 귀를 가만히 세웠다. 무슨 말이든 이어질 다음 말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정식은 아직 임의롭지 못한 사이인 나빈 앞이라서 아무 것도 묻지 못했고, 배찬경은 입을 다물었다. 대신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배찬경이 내뱉은 말을 가슴에 묻고 곱씹었다. 그때 나빈이 나섰다.
“아, 종로 기생 오순이 그런 여자였군. 어쩐지 자꾸 연민을 자아내더니만. 자, 일어나세. 저 청진동 골목 내 단골 주점으로 가세. 거기 자네 보기 역겨워 떠나갔다가 남편 매에 골병이 든 오순 양이 와 있다네. 가세.”
나빈이 정식과 배찬경을 일으켜 세웠다. 배찬경은 실소하면서도 술맛이 당기는지 정식의 손을 이끌고 냉큼 뒤따랐다.
3
치마로 앞가슴을 가린 여자가 일어나 전등을 켰다. 흐릿한 붉은 빛이 방안을 밝혔다. 정식이 벌거벗은 상체를 드러낸 채 막 잠에서 깨어나 실눈을 떴다. 여자가 정식의 머리맡에 앉아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정식의 귓불을 만지작거렸다.
“여자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남자가 잠꼬대일망정 자기 이름을 불러 주는 거예요.”
여자가 이번에는 귓불에 입을 맞추었다.
“하룻밤에 만리성을 쌓는다는 말은 들어 봤지만, 우리가 만난 지는 이제 겨우 서너 시간이 될까? 제가 그리 좋아요? 순이 누이, 순이 누이,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여자가 정식의 귓불을 잡아 흔들면서 대답을 채근했다. 정식이 슬며시 눈을 떴다.
“뭐라고요?”
“아이,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아까처럼 애타게.”
정식이 여자를 매몰차게 밀어냈다. 여자가 정식의 귓불을 꽉 비틀었다.
정식의 가슴 깊은 곳에서 실바람 한 가닥에도 이는 호수의 파문처럼 오순이 되살아났다. 오순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그 일이 무엇일지 아직 찾지 못했다. 오늘은 아무 것도 못 찾았지만, 내일은 무언가를 찾아내야만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 머리를 짓눌렀다.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몹쓸은 꿈을 깨어 돌아누울 때,
봄이 와서 멧나물 돋아나올 때,
아름다운 젊은이 앞을 지날 때,
잊어버렸던 듯이 저도 모르게,
얼결에 생각나는 ‘깊고 깊은 언약’
- ‘깊고 깊은 언약’ 전문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