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하루살이와 천 년의 나무
#3, 하루살이와 천 년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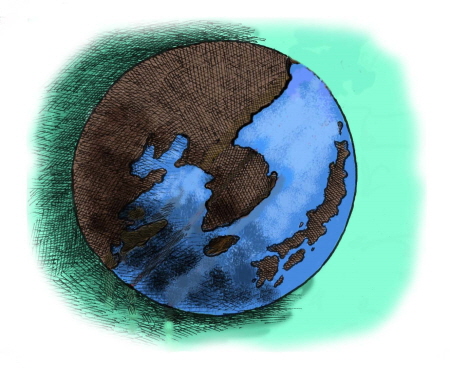
눈을 감고 누운 채로 나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보았다.
‘지구의 종말’
이것이 장자에게 질문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러나 답을 듣지는 못했다.
- 지구의 종말,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 그대는?
꿈속처럼 누군가의 말이 들린다. 장자였다.
- 아, 이렇게 소통을 하는군요.
- 그렇네. 지상과 천부(天府) 사이에 그럼 유선전화라도 놓일 줄 알았나?
장자는 ‘허허’하고 너털웃음을 웃었다.
- 아무런 장치도 없이, 생각에서 생각으로 메신저라니요.
- 맞아. 요즘은 문자가 대세지. 안 그런가?
- 그래요. 직접 만나거나 전화기를 통해 말로 수다를 떨던 인간이 지금은 아주 짧은 단문 메시지로 소통을 하죠. 스카이프나 카톡 같은 것.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도 자동통역 메신저를 통해 문자대화를 나눕니다.
-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본래 전화기나 메신저 같은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 본래 사람과 사람은 이런 기계장치 없이도 소통을 했지 않은가.
- 그랬지요. 말로, 손짓발짓으로….
- 언어나 손짓발짓 모두가 사실은 소통 수단일 뿐이야. 소통의 본질은 그런 유형적인 수단 이전에 있는 문제야. 생각을 나누는 것이 본질이지.
- 그런가요? 그런데 언어나 표정이나 손짓 발짓 같은 것으로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죠?
- 한 마디로 ‘마음’이지. 마음과 마음은 소통을 한다고.
- 마음의 소통이라.
- 생각해보게. 나는 고대어를 쓰고 그대는 21세기 언어를 쓰네. 이걸 각기 문자 메시지로 보낸다면 서로 알아들을 수나 있으리라 생각하나?
- 그러게요. 마음의 소통은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가 보군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아무런 메신저도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러고 보니 이건 어떻게 한 거죠?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
- 하하하. 어떻게 가능하겠나.
- 꿈이니까?
- 꿈이 아닐세. 나와 같이 천부까지 다녀오질 않았는가.
- 그렇군요. 하여튼 과학적 수단은 아닌 것 같아요.
- 천만에. 과학적 수단일세.
- 혹시, 텔레파시?
- 흠. 그 비슷한 거지.
장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해도 나는 그 이상 알아듣지는 못했을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장자와 나는 텔레파시 같은 것을 수단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간주해두기로 했다.
- 그건 그렇고, 지구의 종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으셨죠?
- 그랬지.
- 빅뱅이라도 일어나는 건가요? 핵폭발로 지구가 산산조각 난다든가, 아니면 자전축이 바뀌면서 지구가 비틀거리다가 속도를 잃은 팽이가 넘어지듯 중심을 잃는 바람에 우주 미아가 되어 태양의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거대한 우주의 블랙홀이 지구를 집어삼키기라도 해서 지구 역사가 끝나게 되나요?
- 이런. 너무 극단적이군.
- 아, 죄송합니다. 뭐 종말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아서요.
- 진정하게. 지구 역사가 40~50억년 된다고 하지 않는가. 그 중에 인간의 역사는 단 1억년도 안되네. 천만년 백만년은 되던가?
- 어림없죠. 훨씬 짧지 않나요?
- 그래. 인간이 존재한 시간은 이 긴 지구 역사에서 아주 한 점에 지나지 않아. 그런 인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지구가 함께 사라져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네. 대체 수십억 년의 지구가 그 몇 만 분의 1만큼의 시간도 함께 살지 않은 인류와 최후를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은 무슨 근자감이지? 어림도 없는 얘기네. 과거에 공룡들이나 어떤 벌레들은 지구상에서 백만 년 넘게 존재하다가 사라졌는데도 지구는 눈 하나 꿈쩍 않고 다음 시대를 만들었네.
- 하아, 허무합니다. 마누라가 일찍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새 마누라를 얻고 또 그 마누라가 죽어도 다시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새 마누라를 맞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남편 얘기를 듣는 것 같네요. 그 반대의 경우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 왜? 의리라도 따지고 싶은 겐가?
- 뭐 따져보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으며 단지 ‘인류의 종말’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하지만 지구의 종말은커녕 인류 자신의 종말조차도 목격할 수 없겠네요.
하긴 인간이란 존재는 최소한 45억년으로 추정되는 지구 역사에서 최근의 몇만년(길게 잡아도 20만년 안팎?) 정도를 기생한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인류가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 거대 지구와 종말까지 함께 공존하리라 생각하는 건 주제 넘는 소망일 것이다.
- 목격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 않겠나. 갑자기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고 내가 살던 곳에 지진이 일어나 그것으로 내 목숨이 끝난다고 생각해보세. 죽는 사람 당사자는 이것이 지구 전체에 벌어진 종말적 사건인지 단지 자기 사는 동네에 국한하여 벌어진 국지적 참사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 밖의 지역에서 아무 일 없이 살아남는 사람에게는 아직 종말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겠지만, 뒤집히는 땅 속으로 내던져진 사람에게는 판단이 불가능한 일일 거야.
- 그러니까 진정한 종말은, 아무도 그것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셈이로군요.
- 핵무기가 터져도 마찬가지겠지.
- 공룡시대 넘어 빙하시대 넘어 인류시대도 지나가고 나면 지구에는 어떤 시대가 오게 될까요. 바퀴벌레들의 시대? 아니면 외계인의 시대? (계속)
* 小知不及大知 小年不及大年 (소지불급대지 소년불급대년)
작은 지식으로는 큰 지식을 따라잡지 못하고, 짧은 목숨으로는 긴 시간을 헤아리지 못한다. (<장자> 소요유)
인간을 하루살이에 비유하여, 장자는 인간이 지구나 우주의 긴 역사를 다 헤아리지 못함을 지적했다. ‘아침에 피는 버섯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알지 못하고, 여름에 나고 죽는 쓰르라미는 봄가을과 겨울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은 오랜 지식의 축적을 통해 지구의 역사를 윤곽이나마 밝혀냈고, 지구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빅뱅과 블랙홀의 개념까지 찾아냈다.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도 장자는 예견하고 있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