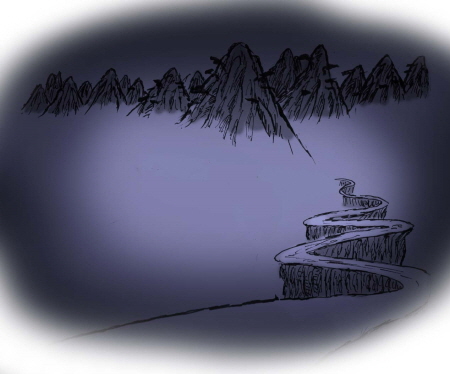
자동차가 이내 마산에 도착했다. 나는 마산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내로 들어갔다. 셔터 내린 상점들, 자동차 한 대 보이지 않는 넒은 도로…… 아직 잠에서 덜 깬 시가지는 유령의 도시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왜 시내로 들어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모텔에 들어가 자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이제 괜찮아졌다면서 계속 달리자고 고집했다. 마산 시내를 일주하고 다시 고속도로를 탔다. 진주 방향으로 달렸다. 끝없이 앞에서 밀려오는 아스팔트 도로와 하얀 차선, 중앙분리대…… 문득문득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자오락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위험신호였다. 함안을 지날 때쯤 동쪽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태양이 떠올랐다.
그녀가 소풍을 가자고 했다.
휴게소가 나왔다. 핸들을 돌려 휴게소 진입로로 들어섰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각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는 소변을 보고 다시 세수를 하고 스트레칭을 했다. 졸음이 싹 가시는 것 같았다. 화장실을 나와 그녀와 함께 매점으로 들어가 어묵과 김밥을 사고, 내가 피울 담배를 두 갑 샀다. 매점을 나오자 강렬한 아침햇살이 눈을 찔렀다. 우리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반원을 그리며 휴게소를 빠져나온 차가 다시 고속도로를 달렸다. 얼마쯤 달리다가 진주 IC를 통해 지방도로로 빠져나왔다.
서서히 진주시내를 한 바퀴 돌았다. 잠에서 깬 사람들이 아침햇살을 받으며 제각기 일터로 물결처럼 이동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진주역, 남강, 촉석루가 지나갔다.
우리는 막 문을 여는 대형 슈퍼에 들어가 카트를 밀며 소주와 캔맥주, 마른안주, 과자, 음료수를 샀다. 만약을 위해 커다란 목욕수건도 두 장 샀다. 야채코너에 진열된 싱싱한 오이, 풋고추, 애호박, 버섯 등이 눈에 들어왔다. 어딘가 집에 들어가 얼큰하게 찌개를 해먹고 푹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슈퍼를 나와 자동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시내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2차선 지방도로를 타고 천천히 북쪽으로 올라갔다.
“와, 오늘 우리 소풍날인데 날씨 너무 좋다.”
빨대로 딸기우유를 빨던 그녀가 헤헤 웃으며 말했다. 하늘에 새털구름이 몇 점 보일 뿐 쾌청한 날이었다.
양옆으로 우거진 가로수들이 시원하게 뒤로 밀려났다. 몇 번인가 리 단위 마을을 지났다. 우유를 다 마신 그녀가 몸을 반쯤 돌려앉은 채 운전하는 나를 말간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지었다.
어디쯤에선가 도로를 벗어나 콘크리트 포장이 된 들길로 들어섰다. 볏잎에 맺힌 이슬방울들이 반짝반짝 아침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어느덧 누렇게 익어 고개 숙이기 시작하는 벼이삭들이 간간이 눈에 띄었다. 멀리 야트막한 산자락에 30여 호의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십여 분 달리자 포장도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마을도 나타나지 않았다. 덜컹거리며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을 천천히 운전했다.
산기슭으로 자동차 한 대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작은 오솔길이 나왔다. 그 길로 들어섰다. 옆에 삐죽삐죽 솟아난 나뭇가지며 억새들이 차 앞유리창과 옆 유리창을 촤아악 긁으며 뒤로 사라지곤 했다. 간간이 차체 밑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가 들려오고, 자갈 튕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길은 계속 이어졌다. 다람쥐 한 마리가 저 앞에 나타났다가 이쪽을 힐긋 보고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정지된 사진 같은 풍경…….
왼쪽으로 하천이 나왔다. 나중에 알고보니 낙동강 지류 내성천이었다. 천변에 사람 키만큼 자란 억새들이 쭉쭉 뻗어 있었다. 오른쪽은 묵정밭, 그리고 높은 산, 하루종일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한적한 곳이었다.
적당한 곳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엔진소리가 멈추자 일순 정적이 찾아들었다. 우리는 안전띠를 풀고 차에서 내렸다.
멍했다.
이 풀에서 저 풀로 풍뎅이, 무당벌레, 메뚜기 따위 작은 곤충들 나는 모습이 마치 무성영화 필름 돌아가는 모습처럼 몽환적으로 보였다.
나는 억새풀을 발로 밟아 넘어뜨리며 밑으로 내려갔다. 억새 잎 서걱거리는 소리에 다시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 끈적끈적한 거미줄이 팔에 걸리고 얼굴에 걸렸다. 그녀가 뒤따라왔다. 갈잎의 날이 팔을 스치자 피가 배어 나왔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쓰라렸다. 육체는 이토록 약한 것이다…….
억새밭 한 끝에 작은 버드나무 세 그루가 나란히 자라고 있었다. 그 아래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황금빛 아침햇살이 하천물에서, 은박 돗자리에서, 눈부시게 반사되고 있었다. 맴맴맴맴 처르르르…… 매미 울음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매미는 애벌레로 어두운 땅속에서 육 년 동안 네 번 허물벗기를 한다. 그리고 칠 년째 지상으로 나와, 우리가 보는 매미의 모습으로 일 주일에서 길어야 이 주일을 산다. 매미 울음소리가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하고 외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우리는 먼저 김밥과 어묵을 먹었다. 그리고 그녀는 캔맥주를 마시고 나는 소주를 마셨다.
매미 울음소리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수한 새들이 제각각 독특한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을 날고, 아주 멀리서 들릴 듯 말 듯 환청처럼 경운기 소리가 들려왔다.
“편안해…… 여기 참 편안하고 좋아…….” 하고 그녀가 말했다.
“응. 소월 시가 생각나.”
“맞아…….”
그녀가 무릎을 모아 끌어안더니 편안한 얼굴로 나직하게 노래부르기 시작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노래를 마친 은영이 눕고 싶다면서 자동차에서 수건을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자동차로 갔다.
수건만 꺼내려다가 나는 자동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아무래도 지금 누우면 그대로 늦은 저녁까지 잠들 것 같아서였다.
천천히 자동차를 앞으로 몰았다. 조금 더 가자 밑으로 내려갈 만한 길이 보였다. 후진기어로 바꿔 조심스럽게 모래톱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계속 후진으로 자동차를 은영이 있는 곳까지 몰았다. 모래가 깊지 않아 바퀴가 빠지는 일은 없었다.
자동차를 세우고 목욕수건과 모자를 꺼냈다.
은영은 수건을 돌돌 말아 머리에 베고 누웠다. 그리고 모자로 얼굴을 비스듬히 가렸다. 그녀의 얼굴 위에서 버드나무 긴 가지가 무심히 허공을 쓸었다.
나는 남은 술을 계속 마셨다. 은영이 누운 채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에 발그레하니 술기가 올라 있었다. 백로와 왜가리들이 꾸르르르 소리를 내며 하천 건너 푸른 숲속으로 날았다.
술병을 모두 비우자 피곤이 전신을 엄습했다.
나는 허위적거리며 억새밭에서 소변을 보고 돌아와 은영의 옆에 나란히 누웠다. 그녀가 내 가슴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뒤에서 아주 작은 바람에도 억새잎 사그락거리는 소리, 매미 울음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세상은 고요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혹성에 단둘이 있는 것 같은 적막감마저 밀려왔다.
“티티카카 생각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