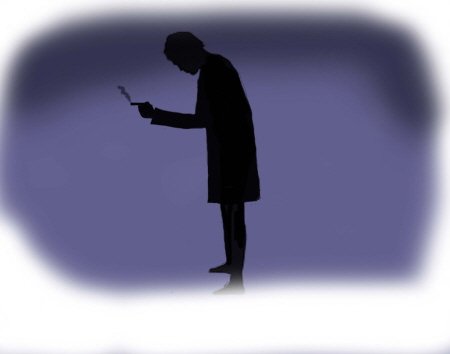
너무 놀라운 경험이 감정기능을 마비시킨 건지, 아니면 이미 모든 결정을 내려서인지, 은영은 씻고 자리에 눕자마자 금방 색색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그녀는 모든 게 정리되었을 테지만 나는 아직 아니었다. 망치로 맞아 머릿속의 코일이 몇 가닥 엉킨 것처럼 계속 멍한 상태였다. 나는 수면등을 켜고 창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피웠다. 둥글게 말린 채 창밖으로 빠져나간 담배연기가 휙, 휙, 바람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곤 했다.
육체는 정신의 집이다. 무너져가는 육체에 그녀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다.
아무래도 동생과 접촉을 해봐야 할 것 같았다. 설령 그녀의 동생을 만나 아무런 해결책도 얻지 못한다 해도 경우의 수는 많을수록 좋았다. 나는 그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숄더백을 뒤졌다. 다이어리, 립스틱과 로션 따위 소박한 화장품, 죽염, 성경, 헤르만 헷세의 크눌프와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허울뿐인 세계화(군데군데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리고 무수한 약봉지들이 보였다. 가방에 달린 지퍼들을 모두 열어보았지만 어디에도 전화기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벗어놓은 옷도 뒤져보았다. ……역시 없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졌다.
그녀가 망망대해를 떠도는 외로운 섬처럼 느껴졌다.
2중으로 된 유리창, 커튼, 전화기, 침대, 소형 냉장고, 거울과 테이블…… 색색거리는 그녀의 숨소리…… 그대로는 도저히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나는 살그머니 모텔을 빠져나왔다.
비를 맞으며 거리를 걷다가 호프집에 들어갔다.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주인이 술과 안주를 내오고 녹음기를 틀었다. 성능 나쁜 녹음기에서 태진아, 설운도, 장윤정, 송대관의 트로트 가요가 계속 이어져 나왔다. 녹음기를 틀어주고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주인은 볼륨을 작게 틀어놓은 선반 위의 텔레비전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텔레비전에서는 미니시리즈가 방영되고 있었다. 그것이 일상이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었다. 나는 맥주를 네 병 비우고, 계산을 치르고 밖으로 나왔다.
그동안 빗발이 거세어져 있었다. 굵은 빗줄기가 보도블록을 요란하게 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때리며 부서졌다. 모텔을 향해 달렸다. 잠깐이었지만 옷이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고 신발이 질척거렸다.
곧장 객실로 올라가는 대신 잠깐 모텔 입구에 서서 골목을 바라보았다. 쏴아, 쏴아아아아아…… 빗줄기가 보도블록을 때리고, 벽을 때리고, 창을 때리고, 골목에 세워놓은 자동차들의 지붕을 때렸다. 골목은 텅 비었으면서도 꽉 찬 듯했다. 시간이 사라지고 공간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 모습은 어딘지 아직 물과 궁창과 뭍이 하나이던, 그러다가 궁창과 빗발과 뭍으로 분리되던 태초(太初)의 어느 시절을 연상케 했다.
나는 담배를 한 개비 꺼내 입에 물었다. 담배가 젖어 있어 불을 붙이기가 힘들었다. 간신히 불을 붙이고 한숨처럼 후우, 후우, 연기를 내뱉었다.
진퇴양난의 아포리아(aporia). 막다른 골목. 나가는 길도 들어오는 길도 없다.
그녀와 함께 계속 잠수를 하면 살인범의 도주를 도와주는 게 된다. 나는 구속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직장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
어차피 나가는 길도 들어오는 길도 없다면 갇히는 수밖에 없었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의 곤경을 못 본 척하고 혼자 빠져나갈 수는 없었다. 지옥인들 함께 못 가리. 기껏해야 몇십 년 인생, 사랑을 외면하고 수족관 속의 붕어처럼 살 수는 없었다.
나는 담배꽁초를 허공에 튕겨 던졌다. 빨간 불빛이 빙글빙글 허공을 돌다 젖은 골목에 떨어져 치직 소리를 내며 꺼졌다. 나는 진저리를 쳤다.
터벅터벅 계단을 딛고 객실로 올라갔다. 어느 방에선가 크게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가 복도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욕실에서 수건으로 젖은 머리칼과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젖은 옷을 벗고 욕실을 나와 침대로 갔다.
그녀가 작게 신음소리를 냈다. 몸이 아픈 건지 악몽을 꾸는 건지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다. 자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다. 이 고운 여자가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예쁜 여자를, 이렇게 사랑스런 여자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못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 여자를 도와줄 수 없다.
가혹한 운명이었다. 그녀의 운명도 가혹했고, 그런 그녀를 지켜봐야만 하는 내 운명도 가혹했다.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않고 세상을 상대로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일찍 세상에서 밀려나가야 하는 걸까.
이 여자만을 위해 한세상 살기로 했는데, 이 여자로 인해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웠는데, 이 여자 없으면 나도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바보!
그녀를 흔들어 깨워 아까 한 말이 모두 사실이냐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악을 쓰고 싶었다.
나는 몇 번 심호흡을 하여 충동을 누르고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셨다. 그리고 침대로 올라가 그녀 옆에 누웠다. 그녀가 잠결에 몸을 돌려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가 내 품에서 색색거리며 숨을 쉬었다. 피가 흐르는 따뜻한 몸…… 가슴이 으깨지는 듯 아팠다.
어쩌겠는가. 이 여자가 내 마음을 빼앗은 첫 여자인 걸. 다른 여자들은 얼굴이 이상해 보이거나, 머리가 빈 것처럼 보이거나, 너무 이기적으로만 보이는 걸. 이 여자 아니면 도무지 마음이 안 가는 걸. 세상 여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여자이고, 아무도 이 여자를 이길 수 없는 걸.
이 여자가 내 인생의 유일한 여자인 걸. 이 사랑밖에 없는 걸.
나는 그녀의 잠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침대 머리맡에 있는 수면등의 스위치를 눌렀다.
어둠.
자동차가 골목을 지나가는가, 창문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가 고적하게 들려왔다.
술까지 마셨는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계속 빗소리가 들려왔다. 이따금 후둑후둑 빗발이 창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내 품안에서, 은영은 더 이상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얼음우희 댓닢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주글만뎡 / 얼음우희 댓닢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주글만뎡 / 정든 오늘밤 더듸 새오시라, 더듸 새오시라……
고려속요 <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 몇 구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천년 전쯤 어느 추운 겨울밤, 도무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어떤 고려인 남녀는 얼어붙은 땅 위에 거칠게 댓잎 자리 깔고 나란히 누워,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녹이면서, 그 밤이 새고 나면 영영 이별이라 그대로 얼어죽어도 좋으니 시간이 멈춰 날이 새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기원하였다. 님과 나와 어러주글만뎡, 정든 오늘밤 더듸 새오시라…… 더듸 새오시라……
가만히 그녀를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만히 오르락내리락했다. 머리칼을 뒤로 념겨 얼굴을 보았다. 어둠 탓인지 그녀의 얼굴이 한 많은 고려 여인의 얼굴처럼 보였다. 어쩌면 우리 둘이 전생에 <만전춘별사>의 주인공들이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고보니 창밖의 빗소리도 천 년 전 이 땅에 내리던 빗소리 같았다. 천 년의 만남, 천 년의 사랑, 나는 문득 우리가 만났다간 헤어지고 또 만났다간 헤어지며 천 년 전부터 여기까지 함께 온 두 나그네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또 잃어야 한다……. 코끝이 찡하게 아파왔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