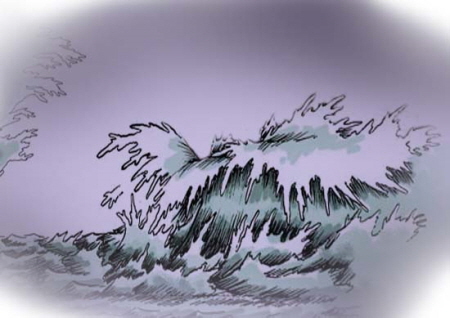
“내 동생 그렇게 한심한 애 아냐. 밤새 싸웠어. 얼마나 힘들게 설득시켰는지 몰라. 때리기도 하고 울면서 빌기도 하고, 그러자고 했다가 또다시 그럴 수 없다고 하고, 결국 아침에 또 번복하면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가족 모두 죽는 거라고 다짐시키고 헤어졌어…… 잘한 선택이야. 앞날이 창창한 동생의 앞길을 막을 수 없어.”
“네 인생은!”
“난 어차피 얼마 못 살고 죽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 백 번도 더 죽였어.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그 해 가을에.”
“……!”
울컥 목이 메어왔다.
그 해 가을이라면 내가 그녀의 동창생들 전화번호를 알아내고도 걸지 못하고 그녀에게 메일을 보냈다가 반송메일을 받았을 즈음이었다. 그녀의 엄마가 아빠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은 아마 그녀가 연락을 끊고 사라진 여름쯤의 일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내 곁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왜, 왜,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어. 왜?”
그녀는 좋은 일은 함께 나누지만 나쁜 일은 혼자 삭히는 편이었다. 자기는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하면서 자기가 신세지는 것은 극도로 싫어했다.
그때 왜 끈질기게 그녀를 찾지 않았는지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시간은 늘 앞으로만 흘러가고, 우리는 한 번 건넌 다리를 다시 건너지 못한다. 나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설명이 되니? 너에게 내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녀가 울먹이며 내 팔을 잡았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야.”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 나는 어금니를 악물었다.
“이제 우리 집에 희망은 동생밖에 없어. 못 살았지만, 잘 죽고 싶어.”
멀리 흐린 하늘에 갈매기들이 나는 모습이 보였다. 바다는 여전히 잠잠했다.
나는 담배를 끊고 후우, 후우, 숨을 골랐다.
“그곳에 동생 지문 남아 있지 않아?”
“다 지웠어.”
“그러길래 시간 맞춰 밥 먹으랬잖아! 바보같이 이게 뭐야, 새파란 나이에 위암이 뭐야!”
또다시 울컥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받쳐 올라왔다.
라면에 떡볶이, 인스턴트 커피, 술, 담배. 그것이 그녀의 주식이었고, 그나마 불규칙했다. ‘밥이 보약’이라는 내 말을 ‘노인네 같은 소리’로 일축해버리곤 하던 그녀였다. 언젠가 속이 쓰리다고 아랫배를 끌어안고 잠 못 자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겔포스만 있으면 된다고 고집을 피웠었다. 그때 강제로라도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솔직히 나 죽는 것 무서워. 자기 옆에서 죽고 싶어. 함께 있어줘. 부탁이야.”
“우리…… 같이 동생을 한번 만나보자. 셋이 이야기하다보면 길이 열릴지도 모르잖아.”
잠깐 말없이 나를 바라보던 그녀가 내 담뱃갑에서 담배를 한 개비 꺼내 불을 붙였다.
“이미 결정난 일이야. 다시 만나면 그나마 다 헝클어져.”
“말했지만 요즘 세상에 위암은 죽을병 아니야. 수술받고 항암치료 잘 받으면 돼. 재판 받으면서 수술 받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둘 다 살 수 있어.”
“그러다 재판 받는 그 긴 기간 동안 거짓말이 탄로나면?”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 그러니까 셋이 머리 맞대고 얘기해보자는 거 아냐.”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이대로 깨끗하게 죽고 싶어. 생명을 구걸하다가 병원에서 환자로 추하게 죽고 싶지 않아. 암병동에, 요양원에, 그 많은 주사에 그 많은 약, 그래도 암세포는 번지고 머리칼 빠지고, 피 토하고, 혼자서는 대소변도 못 보고, 여기저기 망가지고 문드러지고…… 나 싫어.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난 존엄하게 죽고 싶어. 난 내 인생을 택했고, 어쨌든 후회 없이 살았어. 내 죽음도 그랬으면 좋겠어. 자기한텐 미안해.”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고!”
“자기는 함께 여행해주면 돼. 자기한테 직접 전화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냈을 때 나는 도박을 한 거야. 하루만에 자기가 이메일을 읽고 안동까지 와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자기는 정확히 그 시간, 그 장소에 나타났지. 난 자기를 믿기로 했어. 그냥 함께 있어줘.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웃으며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네 죽음을 확인하라고? 나는 어떡하고? 너네 엄마는……?”
“…….”
그녀가 대답 없이 손에 쥔 빈 캔을 이리저리 돌렸다. 얼굴에 한(恨)이 느껴졌다.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그래서 행과 불행이 순환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당장의 작은 불행쯤은 누구라도 기꺼이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은 유리컵처럼 우리를 덮어버리고, 한 생에서 향유할 수 있는 행복의 총량이라는 게 생기고, 한이 생긴다.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그 길밖에 없어.”
“말도 안 돼. 병원에도 한 번 못 가보고…… 어떻게 그 길밖에 없는 거니, 응?”
목이 메이면서, 불시에 눈앞이 흐려왔다. 나는 눈을 깜박이며 고개를 돌렸다.
“울지 마라, 바보.”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자기가 나보다 더 아파? 나도 웃는데 남자가 그게 뭐야.”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마음의 동요를 자제하고 있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뜻도 되었다.
그녀는 끝내 울지 않았다.
“그래, 잘났다. 잘났어.”
“도와줘. 솔직히 나 너무 무서워. 자긴 아무것도 모르고…… 나하고 여행하는 거야.”
“…….”
할 말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고 속이 상했다.
자동차 안이 견딜 수 없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나는 차에서 내려 바다를 향해 후우, 후우, 심호흡을 하며 이리저리 왔다갔다했다. 점점 먹빛으로 번져가는 흐린 하늘, 흐린 바다, 흐린 머릿속…… 아무것도 명료한 게 없었다. 모든 것이 왠지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차 안에서 걱정스런 눈빛으로 나를 내다보는 은영의 모습이 보였다.
일단은 그곳을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나는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자동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휴게소를 나와 가던 방향으로 계속 길을 갔다. 왼쪽으로 달마산, 두륜산을 끼고 강진으로 올라갔다. 강진에서 다시 장흥을 거쳐 보성으로 향했다. 나는 핸들을 쥐고 말없이 앞만 노려보았다. 그녀도 창밖을 내다보며 계속 말이 없었다. 동쪽 하늘에 희미하게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계속>
